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면서부터 우린 조직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질문을 망설이는 이유가 유년시절에 겪은 조직생활에서부터 이어져 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린 누구보다도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분위기를 파악하고 질문을 하는 등의 눈에 띄는 행동은 삼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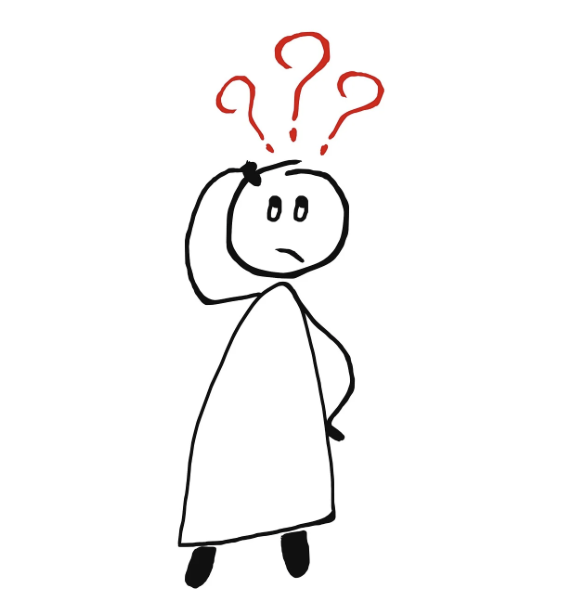
회사에 들어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업무가 아니라 분위기다.
어떤 말이 허용되는지, 어떤 질문이 환영받는지, 그리고 무엇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안전한지. 특히 질문에 관한 감각은 생각보다 빠르게 체화된다. 질문을 잘하면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질문 하나로 ‘아직 파악이 안 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궁금한 게 있어도 한 번 더 삼킨다. 이 글은 바로 그 질문을 망설이게 만드는 심리, 그리고 질문이 사라진 조직에 남는 침묵에 대한 이야기다.
질문 하나에 붙는 보이지 않는 평가들
업무를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순간은 필연적으로 찾아온다.
맥락이 빠진 지시, 배경 설명 없이 내려온 결정, 갑자기 바뀐 기준. 이럴 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질문이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종종 계산의 대상이 된다.
“이걸 질문해도 될까?”
“너무 기본적인 걸 묻는 건 아닐까?”
“다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모르는 건가?”
질문을 던지기 전,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서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질문을 했을 때 받을 반응, 그 질문이 나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남길지, 혹시 ‘일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으로 분류되지는 않을지. 이 고민은 질문의 내용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특히 질문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조직에서는 질문이 곧 능력 검증의 도구처럼 느껴진다. 잘 정리된 질문은 칭찬받지만, 조금이라도 기본적인 질문은 “그것도 모르세요?”라는 반응으로 돌아온다. 이런 경험이 한두 번 쌓이면, 질문은 더 이상 안전한 선택지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 대신 다른 방법을 택한다.
혼자 검색하고, 과거 자료를 뒤지고, 눈치를 보며 주변 대화를 엿듣는다. 공식적으로 묻지 않아도 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무의 정확도보다는 평가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질문이 사라질수록 늘어나는 침묵의 비용
질문이 없는 조직은 겉보기에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회의는 빠르게 끝나고, 모두가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종종 착각이다. 말하지 않았을 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질문을 하지 않는 대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한다. 같은 지시를 듣고도 각자 다른 결과물을 내놓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나중에 가서야 문제로 드러난다. “왜 이렇게 했어요?”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이미 시간과 에너지는 한참 소모된 뒤다.
질문이 없는 문화는 결국 침묵의 비용을 만든다.
처음에는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게 부담스러워서 말을 아꼈지만, 나중에는 수정, 재작업,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 그 대가로 따라온다. 그럼에도 질문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이 구조가 아니라 개인의 태도로 오해되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자주 나오지만, 정작 질문을 안전하게 만드는 장치는 마련되지 않는다. 질문했을 때 불편해하는 분위기, 바쁜 사람에게 시간을 뺏는다는 죄책감, 그리고 질문하는 순간 붙는 미묘한 평가들. 이런 요소들이 그대로인 한, 질문은 개인의 용기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조직 안에는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는다.
정확히 말하면, 질문을 속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남는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회의실이 아니라 퇴근 후 메신저나 개인 노트 속에 쌓인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이 적응한 조직의 모습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면, 사람은 빠르게 적응한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아는 척하며 넘어가는 법을 배운다. 처음에는 불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불안마저 무뎌진다. 그렇게 조직에는 ‘문제없이 돌아가는 듯한’ 일상이 유지된다.
하지만 이 적응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질문을 하지 않는 문화에 익숙해질수록, 새로운 시도는 줄어들고, 기존 방식에 대한 의문도 사라진다. 왜 이렇게 하는지보다는, 그냥 이렇게 해왔다는 이유가 더 강해진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침묵하는 사람들은 대개 신입이나 주니어다.
질문을 많이 해야 할 시기에 질문을 하지 못하면, 배움은 느려지고 자신감은 줄어든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도 질문하지 않는 선배가 된다. 질문 없는 문화는 이렇게 재생산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직은 종종 말한다.
“자율적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내주세요.”
하지만 질문을 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말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질문은 권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질문을 하면 ‘일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망설이는 심리는 개인의 소심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조직이 오랜 시간 만들어온 신호의 결과다. 질문했을 때 어떤 반응이 돌아오는지, 누가 질문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질문 뒤에 평가가 따라오는지.
질문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효율이 아니라 침묵이다.
그리고 그 침묵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해준다. 지금 이 조직에서,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위험한지를.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첫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른다.
“왜 아무도 질문하지 않을까?”
그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조직의 침묵은 계속될 것이다.